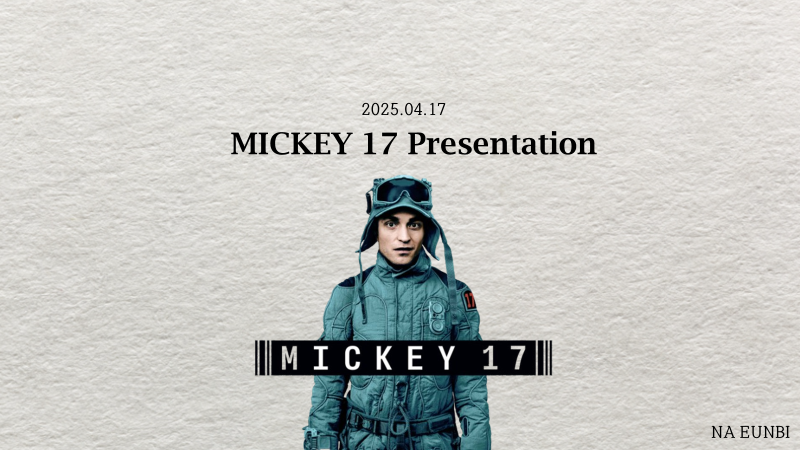
[강조형] 발표 스크립트 with 예시
안녕하세요, 『미키 17』 발표를 맡은 나은비입니다.
혹시 “죽는 게 직업이라면, 여러분은 계속 살아있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 영화 개요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으로, 복제, 죽음,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주인공 미키는 ‘익스펜더블’, 즉 ‘소모품 인간’이에요.
죽으면 복제체가 다시 살아나는 구조고, 미키는 무려 17번째 복제체입니다.
Life In the World
그런데 이번엔 죽지 않은 채 살아남게 되고,
시스템은 새로운 복제체 미키 18을 또다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하나의 미키만 존재해야 한다”는 규칙 속에서,
살아남은 미키17은 존재 자체가 오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Information Poverty

👥 주요 인물 및 관계
미키 17: 순종적이고 죄책감이 많아요. 죽으라면 죽는 인물이죠.
미키 18: 더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인물입니다.
나샤: 분노와 폭력의 감정을 갖고 있지만, 미키의 인간성을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케네스 마샬과 아내 일파: 미키를 ‘소모품’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 권위주의자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미키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죽어야 하지?”

🧩 핵심 분석 ① – Life in the Round
‘Life in the Round’는 사회가 짜놓은 규칙 안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먼저 Life in the Round는 사회학적으로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 갇힌 인간의 삶을 말합니다.
미키의 세계는 우주 식민지라는 좁고 폐쇄된 사회예요.
그 속에서 미키는 진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미키는 단순한 우주 정착민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 복제되어 다시 태어나는 '소모품'으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미키는 방사능 구역 수리를 하러 갔다가 실험 대상이 됩니다.
✔ 또,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인공배양육의 실험 대상이었고,
✔ 게다가 그 배양육의 고통을 줄인다며 준 진통제가
오히려 고통을 증폭시키는 실험용 약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책임자의 아내는 “네 피로 내 카펫 더럽히지 마. 저쪽 가서 죽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 보여주죠.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죽어도 당연시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겨지는 현실. 이것이 미키의 삶입니다.


🧩 핵심 분석 2 - Social Types & Norms
사회적 유형과 규범은 시스템이 개인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미키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에 공감 받지 못하고,
“죽는 건 네 역할이야”라는 폭력적 말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도 “카펫에 피 묻히지 마”라는 말로 무시당하죠.
이처럼 사회가 기대하는 ‘올바른 행동’은 죽음조차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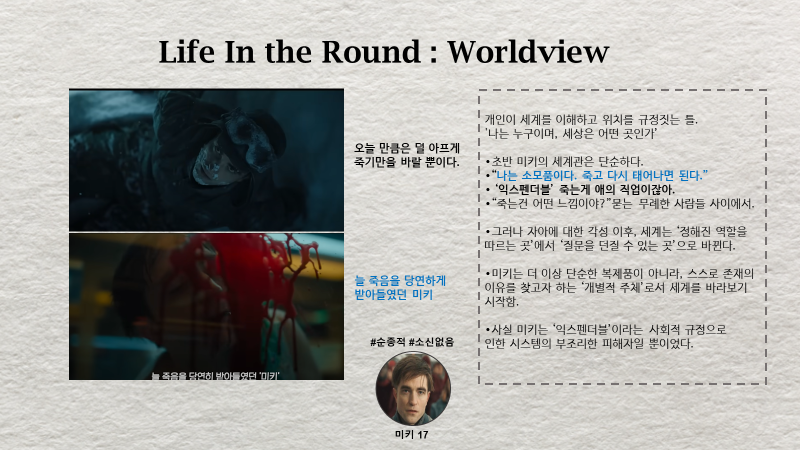
🧩 핵심 분석 3 – Worldview의 변화
처음엔 미키도 스스로를 소모품이라 믿어요.
“죽는 게 내 일이잖아.”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후, 그는 질문을 품기 시작해요.
예:
“죽는 건 어떤 느낌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시스템의 피해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미키는 ‘사회가 말하는 나’에서 ‘내가 정의하는 나’로 시선을 옮겨갑니다.

🧩 핵심 분석 ③ – Information Poverty 이론 적용
📌 Secrecy (은폐)
미키17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숨깁니다.
왜냐면 시스템은 “죽어야 다음 복제체가 나온다” 규칙이 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건 시스템 입장에서 ‘에러’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조직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건 곧 삭제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 정보를 숨기는 건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죠.

📌 Deception (기만)
은폐를 넘어서, 미키는 적극적으로 속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 미키 18인 척 연기를 하고,
✔ “나샤, 내가 네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며 기억을 가진 미키임을 주장하죠.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질서 자체를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Situational Relevance (상황적 관련성)
-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배척함
- 복제체 처리 절차에 대한 무지
- 미키17은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자신을 '에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제체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회피합니다. 이는 자신이 제거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 감시 범위에 대한 선택적 수용
- 미키17은 시스템의 감시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감시 카메라의 위치나 작동 시간을 파악하여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 감정적 판단보다 이득 중심의 정보 분석
- 미키17은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생존에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정보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맺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 Situational Relevance (상황적 관련성)
미키는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입니다.
예:
✔ 감시 카메라 위치에 맞춰서 움직이고,
✔ 복제체 폐기 절차는 일부러 안 알아보려고 해요.
✔ 인간관계도 생존에 유리한 관계만 유지하죠.
➡️ 정보 과잉 사회 속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필터링 전략입니다.

📌 Risk-taking (위험 감수)
마지막엔 미키가 드디어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미키 18과 공존을 모색해요.
그리고 책임자를 죽이고,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죠.
➡️ 이제 그는 정보의 순응자가 아니라, 정보의 주도자입니다.

🧠 결론
『미키 17』은 단순한 SF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이에요.
시스템이 규정하는 역할에 침묵하거나 기만하거나, 때로는 저항하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사회가 만든 유형인가, 아니면 나만의 존재인가?"
저 역시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와 시스템이 만든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위해 존재하는 나인가?, 그러다보니 저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사회의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흐름을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나은비였습니다.
[강조형] 발표 스크립트 with 예시
안녕하세요, 『미키 17』 발표를 맡은 나은비입니다.
혹시 “죽는 게 직업이라면, 여러분은 계속 살아있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 영화 개요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으로, 복제, 죽음,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주인공 미키는 ‘익스펜더블’, 즉 ‘소모품 인간’이에요.
죽으면 복제체가 다시 살아나는 구조고, 미키는 무려 17번째 복제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죽지 않은 채 살아남게 되고, 시스템은 새로운 복제체 미키 18을 또다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하나의 미키만 존재해야 한다”**는 규칙 속에서,
살아남은 미키17은 존재 자체가 오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 주요 인물 및 관계
- 미키 17: 순종적이고 죄책감이 많아요. 죽으라면 죽는 인물이죠.
- 미키 18: 더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인물입니다. 나샤와 연인이죠.
- 나샤: 분노와 폭력의 감정을 갖고 있지만, 미키의 인간성을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 케네스 마샬과 아내 일파: 미키를 ‘소모품’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 권위주의자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미키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죽어야 하지?”
🧩 핵심 분석 ① – Life in the Round
‘Life in the Round’는 사회가 짜놓은 규칙 안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미키의 세계는 우주 식민지라는 좁고 폐쇄된 사회예요.
그 속에서 미키는 진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미키는 방사능 구역 수리를 하러 갔다가 실험 대상이 됩니다.
✔ 또,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인공배양육의 실험 대상이었고,
✔ 게다가 그 배양육의 고통을 줄인다며 준 진통제가 오히려 고통을 증폭시키는 실험용 약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책임자의 아내는 **“네 피로 내 카펫 더럽히지 마. 저쪽 가서 죽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 보여주죠.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 핵심 분석 ② – Worldview의 변화
처음엔 미키도 스스로를 소모품이라 믿어요.
“죽는 게 내 일이잖아.”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후, 그는 질문을 품기 시작해요.
예:
“죽는 건 어떤 느낌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시스템의 피해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미키는 **‘사회가 말하는 나’에서 ‘내가 정의하는 나’**로 시선을 옮겨갑니다.
🧩 핵심 분석 ③ – Information Poverty 이론 적용
📌 Secrecy (은폐)
미키17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숨깁니다.
왜냐면 시스템은 **“죽어야 다음 복제체가 나온다”**는 규칙이 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건 시스템 입장에서 **‘에러’**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조직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건 곧 삭제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 정보를 숨기는 건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죠.
📌 Deception (기만)
은폐를 넘어서, 미키는 적극적으로 속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 미키 18인 척 연기를 하고,
✔ “나샤, 내가 네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며 기억을 가진 미키임을 주장하죠.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질서 자체를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Situational Relevance (상황적 관련성)
미키는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입니다.
예:
✔ 감시 카메라 위치만 외워두고,
✔ 복제체 폐기 절차는 일부러 안 알아보려고 해요.
✔ 인간관계도 생존에 유리한 관계만 유지하죠.
➡️ 정보 과잉 사회 속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필터링 전략입니다.
📌 Risk-taking (위험 감수)
마지막엔 미키가 드디어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미키 18과 공존을 모색해요.
그리고 책임자를 죽이고,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죠.
➡️ 이제 그는 정보의 순응자가 아니라, 정보의 주도자입니다.
🧠 결론
『미키 17』은 단순한 SF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이에요.
시스템이 규정하는 역할에 침묵하거나 기만하거나, 때로는 저항하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사회가 만든 유형인가, 아니면 나만의 존재인가?"
감사합니다.
🎤 발표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에 대해 발표할 나은비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SF가 아니라, 정체성, 윤리, 시스템, 그리고 인간다움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먼저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류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익스펜더블’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고, 죽으면 복제체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미키 17은 17번째 복제체이고, 이전의 16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죽지 않은 채 살아남게 되고, 새로운 복제체 미키 18과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설정에서부터, 영화는 시스템의 원칙과 존재의 자격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주요 주제를 풀어보겠습니다.
- 미키 17은 순종적이고 착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죄책감과 의문을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 미키 18의 여자친구인 나샤는 분노와 저항의 감정을 보여주는 인물이며,
- 책임자 케네스 마샬 부부는 독재적이며 인간을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는 인물들입니다.
- 그리고 미키의 친구 카이 캇츠는 유일하게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서 제가 주목한 개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Life in the Round
먼저 Life in the Round는 사회학적으로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 갇힌 인간의 삶을 말합니다.
미키는 단순한 우주 정착민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 복제되어 다시 태어나는 '소모품'으로 기능합니다.
그의 직업은 우주선 수리가 아니라 사실상 방사능 실험, 백신 테스트, 인공육 실험의 도구였습니다.
죽어도 당연시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겨지는 현실. 이것이 미키의 삶입니다.
🔸 Social Types & Norms
사회적 유형과 규범은 시스템이 개인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 미키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에 공감 받지 못하고,
- “죽는 건 네 역할이야”라는 폭력적 말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도 “카펫에 피 묻히지 마”라는 말로 무시당하죠.
이처럼 사회가 기대하는 ‘올바른 행동’은 죽음조차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 Worldview의 변화
하지만 미키는 점차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소모품이다”라고 여겼지만,
자신의 존재가 잘못됐다고 판단받는 순간, 그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미키를 단순한 복제체에서 개별 주체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이 영화의 중요한 분석 틀 중 하나인 Information Poverty, ‘정보 빈곤’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1. Secrecy (은폐)
미키 17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시스템은 복제체가 두 명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이건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기 위한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 2. Deception (기만)
미키는 단지 숨기기만 하지 않습니다.
죽은 척을 하고, 일을 대신 수행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타인을 속입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기만의 기술’입니다.
🔸 3. Situational Relevance (상황적 관련성)
미키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감시 카메라 위치, 복제 절차, 위험 회피 방법만을 선택적으로 학습하고, 나머지는 차단합니다.
이는 정보 과잉 사회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터링 전략이기도 합니다.
🔸 4. Risk-taking (위험 감수)
그러나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미키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을 뒤흔들기 위해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자를 죽이고,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은,
더 이상 정보 순응자가 아닌, 정보 주도자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마무리
결국 『미키 17』은 단순한 SF가 아니라,
사회가 정의한 '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여정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회가 말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생존하고, 질문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
그 한 마디를 관객에게 던지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 팁
- Q: 미키 17이 사회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탈주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요?
- Q: 실제 사회에서도 정보 은폐나 기만은 생존 전략일 수 있을까요?
- Q: 시스템에 저항하는 개인은 언제나 ‘영웅’일까요, 아니면 위험요소일까요?
'개인 프로젝트 > 대학원 수업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계대수] 해석 문제 (0) | 2025.04.19 |
|---|---|
| [데이터베이스시스템특론] 수업 자료내용 (0) | 2025.04.14 |


댓글